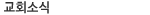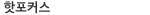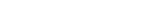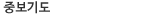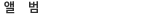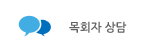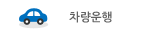조용한 저녁식탁.
무심한듯 남편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차암
그때 내가 중3이었는데
어쩌자고 어머니가 아니고 나를 데려가셨을까...
폐암 확진판정이 기다리는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일을 말합니다.
엉터리야 그놈들, 날더러 암이래. 암이랜다.
그리고 아무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몇번인가 이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의 말은 항상 여기에서 멈춤니다.
그 때 열일곱이던 소년이 ,
그 때 쉰셋이던 아버지 나이를 넘어선 지금
남편은 아들도 되었다가 아버지도 되었다가 하는가봅니다, 그렇겠지요
남편이 아들과 아버지를 무한 반복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며 설겆이를 합니다.
설겆이를 하며 마음이 어느새 어머니께 가닿습니다.
아이 다섯을 둔 마흔여섯의 여인.
중병을 직감하며 의사를 만나러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어머니.
그시간을 어떻게 치루었을까 싶습니다.
외마디로 주여!하다가
부산하게 걸레질을 하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그때의 어머니를 어림짐작하다가 그럴듯한 그림이 보입니다.
쌀을 불려 죽을 쑤지 않았을까요?
석유 곤로를 약하게 올려
천천히 국물하나도 넘치지 않게 젓고 저으면
희던 쌀 알이 투명해지고, 마침내...보드라운 죽이 준비됩니다.
돌아온 부자 앞에
말대신
조그마한 상이 놓이고
흰죽한그릇, 양념종지,무언가 초록나물 한가지, 그리고 조금작게 썰어놓은 김치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을 쑤는 손길이, 나물을 삶아 데치는 안타까움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에겐 간절한 기도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남편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와 아내 자리에 있는 오늘의 나도
매일매일 기도같은 밥상을 차리는 이가 되고 싶습니다.